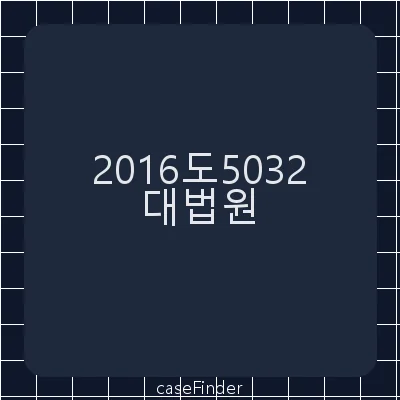2016도5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 대법원 2016.06.23
2016도5032 | 형사 대법원 | 2016.06.2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판시사항
[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징역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요지
[2]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어느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지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역형 역시 실효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성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앞서 본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의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지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역형 역시 실효되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00. 9. 26.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② 2005.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③ 2008. 6. 5.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고, ④ 2012. 6. 1.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본다.
① 전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다. 그런데 ① 전과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②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① 전과도 그 무렵 자체의 실효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①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 전과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③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③ 전과 역시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①, ③ 전과가 제외된다면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는 ②, ③의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는지 등을 살펴 ①, ③ 전과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린 다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판례 대표 이미지